#17, 영웅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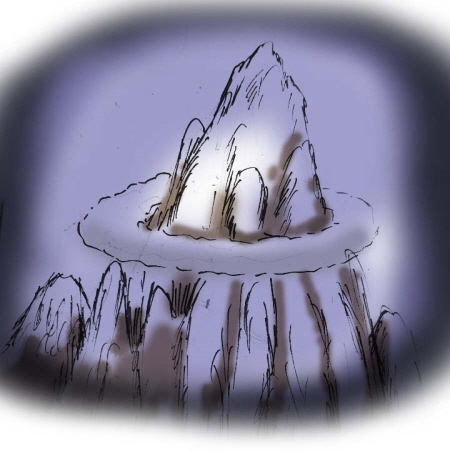
#17, 영웅은 없다
진즉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제야 시작해보겠다.
얼마 전 에베레스트 제1봉의 정상에 오른 남자 이야기다.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1백 년 전 영국인의 이름이다. 그는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 총독부 산하의 지질조사국인가 하는 기관의 측량 책임자였다. 지금이야 산 높이(해발고도)를 항공기나 위성에 탑재한 GPS로 측정하지만, 당시에 산 높이를 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에 속했다. 기원전 몇 세기경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높이를 잰 사람도 있긴 했지만, 사막이라는 평지에 서 있는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재는 것은 사실 손쉬운 일이었다. 삼각형 측량의 원리만 안다면 누구라도 그 높이를 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옛날에 이 원리를 생각해내고 실제로 피라미드 그림자를 이용해 그 높이를 알아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했다.
그런데 히말라야 고지대를 오르내리며 여러 봉우리와 능선들의 높이와 거리를 측량하고 그것을 더하고 빼면서 오르기도 어려운 최고봉의 높이를 잰다는 건 피라미드 측량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더하기빼기와 비례 방정식을 좋아하는데다 몇 박 며칠의 고원 트레킹이나 험준한 산악 등반, 또 캠프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었다. 조사를 다니는 동안 텐트나 측량장비들을 운반하는 세르파(sherpa)들은 물론 벵골 호랑이나 삵, 곰들의 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식량을 조달을 돕기 위해 최신 엽총으로 무장한 사냥꾼들도 동행했을 것이다. 에베레스트라는 관리가 그런 일을 해낸 것이다.
- 잠깐, 하려는 얘기가 뭔가?
- 앗, 그렇군요. 하려던 건 이런 얘기가 아닌데.
- 그래. 본론으로 돌아와 보게.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남자 이야기 말이야.
- 그 남자는 에베레스트 정복을 어려서부터 꿈꾸었어요. 1977년에 그 남자는 열 살의 생일을 맞았지요. 바로 그 생일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등산가 고상돈이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는 뉴스가 신문 방송의 뉴스로 전해진 거에요.
- 오호, 감동이 있었겠군.
- 세계에서 일곱 번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 흠, 그런데 지금 그 말에 어폐가 있네.
- 알아요. 나도. 인간이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은 지금 같으면 적당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1977년 뉴스에서는 ‘정복’이라고 했어요. 그 시절엔 마초적인 언어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고, 그에 따라 개념도 바뀌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는 법이니.
- 그래 하여튼 올라섰다는 얘기지? 태극기 들고 사진도 찍었겠군.
- 그래요. 그땐 ‘깃발 꽂는 것’도 숭상되는 행위였으니까요. 총각들은 맘에 드는 여자에게도 깃발만 꽂으면 자기 여자가 된다고 믿던 시절이에요.
- 에이, 설마.
- 설마라니요. 인간세계는 50년 전만 해도 야만과 문명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여자를 얻었던 남자들이 아직도 현실에 살아있죠.
- 그렇다 치고, 그래. 에베레스트 제1봉에 태극기를 꽂아서 그 봉우리가 대한민국 영토가 되기라도 했나?
- 농담두 잘하십니다.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성조기를 꽂았다고 해서 달이 미국 소유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저 기념사진 찍을 때 아무래도 깃발이 있으면 폼이 좀 나니까 그러는 거였겠죠.
- 하하. 그렇군 그래.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저 거친 에베레스트는 1977년 최초로 찾아온 한국의 산악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정상에 다녀가는 것을 용인해준 거죠. 무사히 다녀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등반대가 등반에 실패하거나 등반도중 사고를 당하는지 잘 아시죠?
- 알다마다. 눈이 녹으면서 엄청난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다더군. 천계의 신선들도 매일 모바일로 온 세계 뉴스를 다 보고 있다네. 그건 그렇고, 그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내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
- 맞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 벌써?
- 그러니까 이 남자도 1977년 그 날부터 가슴에 하나의 꿈을 품었지요.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말겠다는….
- 웅지(雄志)로군. 무엇을 위해서?
- 그도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먹은지 40여년이 지나 마침내 오르고 말았지요. 태극기 한 장을 품고.
- 무사히 돌아왔나?
- 맞아요.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금의환향.
- 온 동네가 떠들썩했겠군.
- 웬걸요. 필생의 꿈을 이루고 자기에게도 떠들썩한 찬사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소박한 소망에 불과했어요. 요즘 세상에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건 더 이상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답니다.
- 이런. 안됐군.
- 여전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드나들었어요. 더 이상 화제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산에 오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그동안에.
- 영웅이 너무 많아졌군.
- 지금은 에베레스트를 다녀와서 여전히 빵을 굽거나 옷가게를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어디서 박사 공부를 하고 와도 대학 교수자리 하나 얻기 쉽지 않죠. 너무 흔하니까. 영웅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 하긴. 영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70년대만 해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위인전의 주인공이었지 않은가.
- 맞습니다. 요즘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다면 과거에 그를 영웅으로 배운 노인들뿐이죠. 오히려 뒤에 자기 스스로 황제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배반자’ ‘혁명의 적(敵)’으로 불리고 있죠. 스탈린, 볼셰비키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들은 이제 과거 영웅들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거든요. 영웅 위인 성인 그런 말은 이제 다 구시대 언어가 되었어요.
- 격세지감이로다. 그런데 하나 궁금하구만. 영웅을 존경하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영웅을 해체한 신세대 사이에 말이 통하는가?
- 가치관이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건 어려운 일 같아요.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만 어울리죠. 가슴에 영웅을 품은 세대와 영웅을 해체한 젊은 세대 사이엔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 단절의 시대로구만. 그래도 그대와 난 3천년 세월을 뛰어넘어 대화를 하고 있거늘.
- 장자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오픈 마인드.
- 그래. 말 잘했네.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