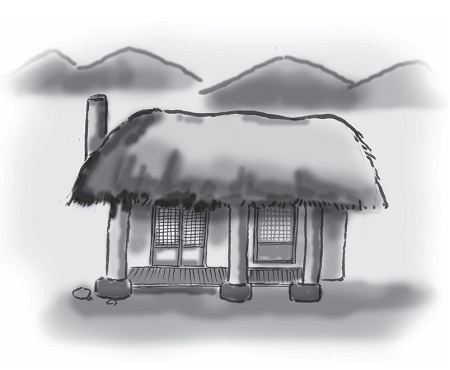
‘일천구백구십사년 여름’ 이라고 나는 쓴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시(詩)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인다.
1994년은 기상 관측 백 년 역사에서 가장 더운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한 해였다. 그해 처음 우리나라에 열대야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가 방영되면서 차인표가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7월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으며, 9월에는 엽기적 범죄조직 지존파가 검거되었다.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해 많은 회사원들과 학생들 목숨을 앗아갔다. 정체불명의 세대라는 뜻의 X세대라는 말이 유행했고, 여학생들 사이에 일본 여학생들처럼 흰색 긴 양말을 신는 것이 급속도로 유행했었다. 그런 해였다.
나는 고등학교 이 학년이었다. 열여덟 살. 누구나 시인일 수 있는 나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렴풋이 안개에 가려져 있고, 머릿속의 모든 것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눈부시도록 선명하게 세상의 진실이 보이는 듯도 하는 아름다운 나이. 늘 ‘지금-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꾸는 나이. 열여덟 살.
여름방학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으로 캠핑을 갔다. 한 친구의 친척집이 그곳에 있었다. 도착한 날 점심밥만 친척집에서 얻어먹고 곧장 근처의 하천으로 나갔다. 아마 남한강의 한 지류였을 것이다. 둑길을 따라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들이 멋지게 열병식을 하듯 늘어서 있는 하천이었다.
우리는 물놀이를 하다가 지치면 밥을 해먹고, 낮잠을 자고 만화책을 보고, 그리고 적당히 술을 마셔가면서 해방감을 만끽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다. 어디선가 이삼십 명의 남녀 학생들이 천변 모래사장으로 몰려나와 맨손체조를 하고, 배구를 하고, 이어달리기 게임을 했다. 수련회를 온 교회 학생들 같았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 친구에게 물어보니 멀리 포플러나무가 담장을 이룬 하얀 건물이 수련원이라고 했다.
갑자기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단발머리 찰랑이며, 뒤쫓는 친구를 돌아다보며, 이리저리 어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애초부터 그럴 운명이었는지, 그만 내 앞에서 발이 겹질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들이 까르륵 웃고 뒤쫓던 친구도 뜀박질을 멈추고 웃음 띤 얼굴로 주먹만 쥐어보였다. 우씨……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를 털던 그녀가 뒤늦게 이삼 미터 앞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더니 멋쩍게 씨익, 웃었다.
(순간, 그녀의 웃음이 고스란히 내 운명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운명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인 것.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우연한 사건일 뿐이다. 그 후 나의 눈은 그녀만 따라다녔다. 윤기 나는 하얀 뺨, 티셔츠 속에서 봉긋 솟아오른 가슴, 샌들을 꿰어 신은 물풀 줄기 같던 발, 찰랑거리던 검은 머릿결, 머루빛 눈…… 나는 캐플릿가의 축제에 몰래 숨어 들어간 로미오처럼 가슴 설레었다.
꿈길처럼 흐르는 오카리나 연주에 따라 땀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부르는 ‘A time for us’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젊음이란 무엇인가요? 격렬한 불꽃이지요. 처녀란 무엇인가요? 얼음이면서 갈망이지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장미꽃이 피었다가 시들 듯 젊음도 그렇지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미소가 잠시 동안 꽃을 피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미꽃이 피었다가 시들 듯 젊음도 그렇지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오후, 나는 텐트에서 허영만과 고행석의 만화를 보고 있었다. 친구들은 읍내에 컵라면이며 모기향, 음료수 따위를 사러가고 나 혼자였다.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만화책에서 눈을 떼고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버드나무 아래 앉기 좋게 넓적한 바위가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 그곳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다. 어제의 그 여학생이었다. 반바지에 교회 이름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다. 언젠가 몇천 년 전에,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본 듯한 착각마저 밀려왔다. 그녀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내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잎새들, 그 잎새들 사이를 부드럽게 유영하는 은빛 하모니카 선율, 햇빛을 반사하며 흐르는 맑은 물……♩♪♬~~~♪♩♬♪~~♩♬♪~~♩♩♬……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찬송가와 함께 ‘사랑으로’, ‘등대지기’, ‘스와니 강’ 등을 불었던 것 같다. 나는 하모니카가 그렇듯 가슴 저미는 소리를 내는 악기인 줄 처음 알았다. 하모니카 선율은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와, 바람에 흔들리는 초원처럼 내 가슴을 일렁이게 했다.
수련원 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소리쳐 불렀다. 그녀는 노래책과 하모니카를 두고 그쪽으로 갔다.
나는 텐트에서 나와 모래톱을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전자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모양인지 읍내로 나간 친구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넓은 모래톱에 사람이라곤 나 혼자뿐이었다. 이따금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뛰고, 하천 건너편 텃밭에서 옥수수들이 강렬한 태양 아래 소리 없이 익어갔다.
자꾸 내 시선이 버드나무 그늘의 하모니카로 향해졌다.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모니카는 멀리서도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그 빛에 끌리듯 슬금슬금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듯 재빨리 하모니카를 집어들어 품에 넣었다.
그녀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얼른 텐트 속으로 들어가 만화책을 펼쳤다.
그녀는 하모니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안타깝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 번인가 우리 텐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내 가슴이 쿵쿵 뛰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기나긴 영원과도 같았다. 나는 기회를 봐서 그녀에게 하모니카를 돌려주며 말을 걸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다가올 듯 다가올 듯하더니, 그대로 수련원 쪽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
하모니카 금속커버 한 귀퉁이에는 ‘황은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부를 때 은영아! 하고 소리쳤던 것 같았다.
나는 하모니카를 내 배낭 맨 밑에 숨겨두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햇빛이 붉은 기운을 띨 때쯤 친구들이 슈퍼 봉지를 흔들며 둑길을 걸어 돌아왔다. 오락실에서 말을 붙인 여학생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한 친구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땄다고 좋아했다. 슈퍼 봉지 안에는 김밥과 컵라면, 치킨, 캔맥주 등이 들어 있었다. 식사당번들이 요리하기 싫다면서 사온 것들이었다.
김밥과 컵라면은 밤에 출출해지면 먹기로 하고, 일단 치킨과 캔맥주로 배를 채우고 느긋하게 텐트에 누웠다. 친구들은 아까 만났던 여학생들을 두고 누가 예쁘다 누가 더 예쁘다 각자 열변을 토했다.
내 시선은 계속 수련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텐트 밖에 내놓은 쓰레기봉지에 붕붕거리며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교회 셔츠를 입은 남학생 셋이 모래톱을 밟으며 이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가슴이 한 계단쯤 철렁 내려앉았다.
<계속>
